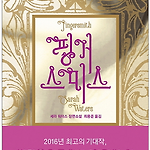p.104
송장이 되어도 친정에는 안 간다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고 해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놓는데 사립문에 몸을 가누고 돌아보며 돌아보며 가는 어미를 바라보고 서 있는 딸, 야무네는 길이 눈에 보이질 않았다. (....)
그것이 지난 가을의 일이었다. 그러고는 소식이 없다. 야무네는 부엌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저녁 죽거리를 하려고 삶은 고구마순의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시레기는 벌써 떨어졌고 산나물도 한 보름쯤 지나야... 야무네는 부엌 밖의 하늘을 힐끗 쳐다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부터 내려앉고, 다음엔 딸의 얼굴이 떠오른다. 하루에도 몇 번 있는 일이다. 그러고나면 목이 꽉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딸이 죽을 것이란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었지만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픈 것이다. 헛간 같은 방이며 시어머니, 동서의 쌀쌀맞은 눈빛이며 무엇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며 온종일을 지내는가, 그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 때문에 목이 메이는 것이다.
p.179
느릿느릿 징을 치던 두만 아비도 없고 북을 치던 칠성이, 팔팔거리던 윤보 한조는 모두 세월에 쓸려서 가고 없지만 놀이는 변함없이 흥겹고 가슴 설레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무색옷이며, 풀발 선 아낙들의 치마 스치는 소리며, 그러나 하얀 베수건 어깨에 걸고 싱긋이 웃으며 맴을 돌며 장고채를 잡던 인물 잘난 사나이, 이제는 늙고 병든 몸이, 장고도 어깨에 무겁고 맴을 돌 때마다 눈앞은 캄캄하다. 용이는 아들에게 장고를 넘겨주며 눈물짓는다.
p.359
여관 옆을 차가 지나갈 때 차 속에서 서희는 처음으로 여관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층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러나 한 사내가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희는 갑자기 자신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상상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혜관은 효자동 어귀에 선일여관이 있다고 했지 그곳에 누가 있을 것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확실하게 물어보지는 못했을까? 어느 쪽이든 확실하게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희망도 절망도 깡그리 뭉개버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무도 없는 창문, 실제 아무도 없었을 것이란 절망, 차가 멎었을 때 서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